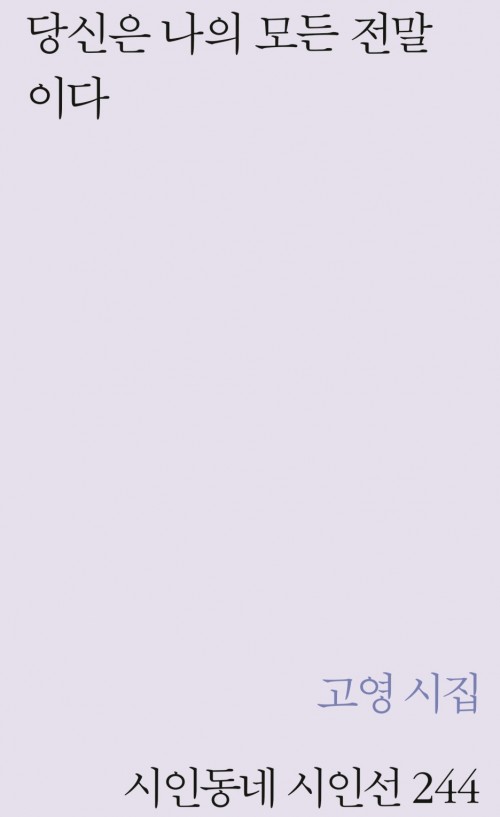당신은 나의 모든 전말이다 / 고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영원히 부재중인 사람에게 보내는 간절한 시편
2003년 《현대시》로 등단한 고영 시인의 네 번째 시집 『당신은 나의 모든 전말이다』가 시인동네 시인선 244로 출간되었다. 이 시집은 ‘아무 관계도 아닌 모든 관계’가 되어버린 한 사람을 떠나보내며 마지막까지 함께한 투병기이자 헌사이며, 영원히 부재중일 한 사람을 다시 살려내려는 고투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다. 혹자는 순애보라고 했고, 혹자는 희생이라고 했고, 혹자는 미친 짓이라고 했던, 그 아름답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이 한 권의 시집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난 뒤, 6년여가 지나서야 고영 시인의 입에서 그녀와의 관계에 대해 겨우, 말이, 흘러나온다. “보호자가 되고 싶었지만 끝내 관여자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관계였다고. 말할 수 없었던 지난 시절을 침묵의 시간이라 한다면, 고영 시인의 현재는 침묵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고영 시인의 시집 해설을 쓴 오민석 단국대 명예교수는 “자신의 모든 전말이었던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이야기이고 살려내도 여전히 부재하는 그 사람을 다시 떠나보내는 이야기”이며 “용납할 수 없는 부재를 용납해야 하는, 터무니없는 현실에 대한 터무니 있는 이야기”라고 이 시집을 정의했다.
그렇다, 이별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이별을 잘 견딘다고 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낸 사람은 그 죽음의 부재를 잘 견디지 못한다. 만약, 견딘다면 부재의 고통을 스스로 해소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망각이다. 하지만 고영 시인은 망각하지 않고 이 시집 속에 한 사람을 오롯이 살려냈다.
내가 생각하는 새의 감정보다
새가 가진 감정이 훨씬 깊다는 것을 알았다.
이해, 라는 말에는 참 많은 뼈가 숨겨져 있다.
2024년 12월
고영
이 시집을 읽다가 새삼 그런 생각이 들었다. 글쓰기는 바로 “나의 모든 전말”인 당신이 부재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 롤랑 바르트(R. Barthes)가 오래전에 『사랑의 단상』에서 짚어 냈던 그 이야기. “글쓰기는 그 어떤 것도 보상하거나 승화하지 않으며, 글쓰기는 당신이 없는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곧 글쓰기의 시작이다.” 사랑이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면, 결핍이 없는 당신이 존재한다면, 상상계의 판타지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글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재와 너무 친숙해서 부재의 자리에서 글쓰기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모든 전말’이었는데 어느 날 그런 당신이 사라져 오로지 부재의 이름으로만 존재한다면, ‘나’는 글을 쓰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 이때 글이란 원고지나 컴퓨터 화면에 기호의 형태로 시각화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신’의 부재 때문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독백이, 울음이 분명한 어떤 신음 같은 것이 흘러나온다면, 그것도 글이다. 글은 당신이 부재하는 곳에서 나오며, 부재의 밀도가 심할수록 밀도 있는 문장이 나오고, 가장 밀도 있는 문장이 시가 된다.
고영의 이 시집은 자신의 모든 전말이었던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이야기이고 살려내도 여전히 부재하는 그 사람을 다시 떠나보내는 이야기이다. 그리하여 이 시집의 시작이 부재라면 과정도 부재이며 종말도 부재이다. 이 시집은 용납할 수 없는 부재를 용납해야 하는, 터무니없는 현실에 대한 터무니 있는 이야기이다. 롤랑 바르트가 “잘 견디어낸 부재, 그것은 망각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고 했듯이, 잘 견디어낸 부재란 없으며, 만약 부재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잘 견뎌서가 아니라 잘 망각해서이다. 그러므로 이 시집은 끝내 견디지 못한 부재에 관한 기록이고, 고영 시인이 앞으로도 그 부재를 잘 견딜 확률은 높지 않으므로 그의 글쓰기는 계속될 것이다. 부재의 글쓰기는 오로지 망각의 때에만 중단된다.
한 사람이 남긴 고통의 문장들을 읽다가 온점에 이르지 못하고 설핏 잠이 들었다.
아주 얕고 삭막한 잠이었다.
꿈결에 나는 누군가의 온화한 목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목소리는 분명 실체를 가진 형상이었는데
새벽닭이 울자
홀연 사라져 버렸다.
지겨운 중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한 사람의 영혼이
새삼 지상이 그리워서 내 몸을 빌렸구나,
상투적으로 추측하고
상투적으로 아침을 먹었다.
눈에 가득 들어차 있지만
끝내 보지 못하고 흘려보냈던 문장들의 상실감에 대해
생각했다.
한 사람이 남긴 고통에 다다르기까지
나는 일관되게
불면이었으며 불운했다.
예고하고 찾아오는 슬픔이 두려웠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났다 사라졌다.
오래전에 종적을 감췄던
내 귓속의 유령이
다시
나타났다.
― 「무중력」 전문
망각하지 못한 부재는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무의식처럼 끊임없이 돌아온다. 그런 부재를 잘 견뎌낼 수 없어서 “나는 일관되게/불면이었으며 불운했다.” 부재는 사라진 과거나 현재가 아니다. 그것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슬픔”, 즉 반복해 도래하는 미래이다. 슬픔은 부재의 알리바이이고 부재의 끈질긴 부적(付籍)이다. 부재는 슬픔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형상”으로 옷을 갈아입고 “내 귓속의 유령”까지 깨우며 항상 “다시/나타”난다. 이 ‘다시 나타남’이 주체에게 부재를 계속 각인하므로 주체 안에서 부재는 현존이 된다. 시인의 글쓰기는 이 부재하지 않는 부재, 부재의 현존에서 시작된다.
프로이트의 손자는 ‘포르트다(fort-da) 놀이’를 통하여 엄마의 부재를 견딘다. 실패를 던지며 ‘포르트’라고 외칠 때 엄마는 멀리 사라지고, ‘다’라고 외칠 때 엄마는 돌아온다. 아이는 이렇게 상황을 상징화하면서 부재를 견디고 현존을 이해한다. 그러나 고영 시인의 부재는 부르지 않아도 오고 불러도 온다. 그것은 상징화를 영원히 거부하는 상상계이다. 그것은 주체와의 분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울상이다. 고영의 부재는 중력 없는 현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중력/무중력의 이분법을 횡단하며 ‘나’와 ‘너’ 사이의 거리를 없앤다.
이 시집은 배영옥 시인의 유고 시집 『백날을 함께 살고 일생이 갔다』(문학동네, 2019)와 대화적 관계 혹은 상호텍스트성의 관계에 있다. 시인 배영옥은 2018년 6월 11일 지병으로 세상을 떴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말기 암 환자에게 가장 혹독했을 투병 생활과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준 이가 바로 고영 시인이다. 그런데 정작 놀라운 점은 이들의 관계다. 지음(知音)이자, 동료이자,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연인일 뿐인 관계. 그러나 ‘아무 관계도 아닌 모든 관계’가 되어버린 관계. 그리고 6년여가 지난 이제야 고영 시인의 입에서 말이, 겨우, 흘러나온다. “보호자가 되고 싶었지만 끝내 관여자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표4글) 관계였다고. 말할 수 없었던 지난 시절을 침묵의 시간이라 한다면, 고영 시인의 현재는 침묵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 오민석(문학평론가, 단국대 명예교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