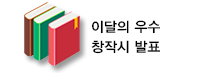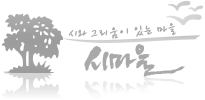[평론]관점 속 시점-메타포어를 형상화하는 언어의 捕執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평론∙
관점 속 시점-메타포어를 형상화하는 언어의 포집
― 작품 속 관찰자의 시점으로 본 현상에 대한 언어적 형상화 연구
김부회(시인・평론가)
1. 서론
가. 시점視點의 사전적 의미
작중 화자話者가 이야기를 풀어가는 시선의 각도, 서술의 발화점, 관점을 뜻한다. 플롯의 기본이 되며, 작품의 효과 및 독자에 대한 호소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점의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문제로 삼아왔으며, 설명하기와 보여주기 방식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시점을 분류하는 방식은 브룩스와 워런의 방식이 대표적으로 1인칭 서술, 1인칭 관찰자 서술, 작가 관찰자 서술, 전지적 작가 서술로 나누었다. 1인칭 시점은 ‘나’가 화자로 등장하는 소설을 말하는데, ‘나’ 자신이 이야기의 중심인물이면 1인칭 주인공 시점, 목격자 또는 이야기의 주변적인 참가자라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 한다. 3인칭 시점은 화자가 특정의 이름이나 3인칭 대명사로 이야기 안의 모든 인물들에 관해서 서술하는 방식이다. 이때 작가가 독자들에게 이야기의 제재를 제시할 때 스스로 부여하는 자유 또는 제한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 전지적 시점과 제한적 시점으로 나뉜다. (『다음 백과사전』 요약 인용)
나. 인칭으로 본 이미지의 추론과 연상
시점의 영어적 표현은 Point of view다. 이는 우리말로 볼 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른바 관점이라는 말과 시점이라는 단어는 일맥의 의미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말이며 관점 속의 시점 또는 시점 속의 관점을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물의 현상을 볼 때 1인칭의 ‘나’ 혹은 1인칭이 보는 ‘나’의 경우에 있어 어느 편에 서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문제는 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야기된 현상의 근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시점이라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대상을 보는 사람의 입장(관점)과 무엇(시점의 각도)을 보며 서술을 풀어 가느냐 하는 것이 관찰자가 말하고자 하는 문장의 배후에 숨은 메타포어를 모색하는 것이며, 메타포어가 주는 비형상적 이미지의 관념적, 또는 비관념적 사유의 고리를 엮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시의 영역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소재라고 한다면 소재의 물질적 외면이 아닌 비물질적 내면을 큰 예각의 각도로 볼 것인지, 가장 좁힌 내각의 눈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가 글의 생명력을 부가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사유의 몰입으로 인도하는 첩경이며, 화자의 입장에서도 글의 전개에 대한 단초이며 결론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논리의 정당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실재적 관점 내지는 시점에서 본 사실적 지각이나 비사실적 의미(이미지의 추론과 연상)가 주는 의미의 전달화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가. 시점의 작품 속 전개 과정 고찰
나는 매춘부인 아내에게 기생하며 유폐된 공간에서 산다.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그날그날 방 안에서 뒹굴며 지내다 아내가 외출하면 심심해서 아내의 방을 살피며 소일한다. 낮잠을 자다 아내가 준 돈으로 경성역 다방에서 차를 마시거나 자정을 기다리며 배회하다 비를 맞고 오한을 견디지 못하는 나, 이른 시간에 돌아와 아내의 매음 현장을 목격한다. 아내가 나를 때리고 집에서 쫓겨난다. 며칠을 앓아누웠던 나는 아내가 준 약이 수면제인 것을 안다. 집을 도망쳐 나와 거리를 쏘다니며 백화점 옥상에 오른다. 26년간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현란한 거리 풍경을 바라본다.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억압된 의식의 해방을 자극한다. 날개를 달고 종속된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충동에 빠진다. 현재라는 질서로부터의 탈출과 해방을 꿈꾸어 본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 이상의 「날개」 전문 요약
「날개」는 널리 알려진 이상의 자전적 소설이다. 이 작품은 관점과 시점이라는 차원의 의미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고백하는 방식이지만 동시에 1인칭 관찰자의 시점 역시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인칭 속의 ‘나’는 허구일 수도 있으며 실존일 수도 있다. 허구와 실존에 대한 글 속의 주체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은 허구의 나를 연속적으로 만들며 파괴하는 것 역시 관점 속의 시점이라는 모래성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글의 전개가 독자에게 보다 신뢰감을 주는 방식의 전개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나와 나를 전제할 때 그 1인칭 속에는 나 이전의 나와 나 이후의 내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타인의 시점이나 관점이 아닌 내 관점의 나와 그 관점의 경계를 일탈하거나 종속되며 사는 나를 본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문학의 가장 큰 주장이며 메시지라는 것이다. 내 시점의 나와 타인의 시점의 나는 분명 다를 수 있으나 주체는 결국 ‘나’라는 인칭이며, 그 인칭이 소망하는 것들과 지향점을 포장하는 방식에 따라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당성의 확보는 타인의 시선이 중심이 되는 것과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의 중심이 되는 양면의 서술점을 갖고 있다. 이상의 「날개」 역시 어쩌면 무기력한 자신을 합리화하며 ‘아내’에 대한 자기만의 관점과 시선을 그 속에 다시 심어 주거나 심는 일이라고 보인다. 1인칭의 내가 나를 보는 시점의 정당성과 내가 내 아내를 보며 서술하는 아내의 심리적 행위 역시 또 다른 정당성의 확보다. 이는 소설을 포함한 시의 장르에서도 다양하게 표출되는 문학적 기법이며 기술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타고 난다는 왼 손금과
살면서 바뀐다는 오른 손금
육십갑자 돌아온다는 그가 오르내린다
양손에 예언서와 자서전
한 권씩 쥐고 사는 것인데
나는 펼쳐진 책도 읽지 못하는 청맹과니
상형문자 해독하는 고고학자 같기도 하고
예언서 풀어가는 제사장 같기도 한 그가
내 손에 쥐고 있는 패를
돋보기 내려 끼고 대신 읽어 준다
나는 두 장의 손금으로 발가벗겨진다
대나무처럼 치켜 올라간 운명선 두 줄과
멀리 휘돌아 내린 생명선
잔금 많은 손바닥 어디쯤
맨발로 헤매던 안개 낀 진창길과
호랑가시나무 뒤엉켰던 시간 새겨져 있을까
잠시 동행했던 그리운 발자국
풍화된 비문처럼 아직 남아 있을까
사람 인人자 둘, 깊이 새겨진 오른손과
내 천川자 흐르는 왼손 마주 대본다
사람, 사람과 물줄기가 내 생의 요약인가
물길 어디쯤에서 아직 합수하지 못한
그 누구 만나기도 하겠지
누설되지 않은 천기 한 줄 훔쳐보고 싶은 밤
소나무 가지에 걸린 보름달이
화투장같이 잦혀져 있다.
― 이영혜, 「손금 보는 밤」 전문
어느 날 화자의 손금을 누군가 봐주고 있다. 손금을 보는 그는 고고학자 같기도 하고 제사장 같기도 하다. 돋보기 속의 눈동자가 내가 쥐고 있는 패로 나의 인생을 읽어 준다.
수상학手相學에서 말하는 손금은 팔자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단순하게 보면 다만 손에 있는 주름인 손금에는 선천성과 후천적 삶이 공존한다. 손금을 보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결국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기회를 찾고자 함일 것이다.
화자는 손금의 해설을 들으며 간과하고 지났던 삶의 몇 부분을 되돌아본다. 운명을 타고난다는 왼손과 살면서 운명이 바뀐다는 오른손 손금을 동시에 쥐고 살았다. 손바닥에 그어진 수많은 질곡의 세월을 돌아보게 하는 것, 그리고 아직 유효한 바꿀 수 있는 운명에 대해 어쩌면 소망의 한 줄기 빛을 기원하는 화자의 심성을 엿본다.
자신의 삶을 손금에 빗대 본다는 것은 관찰이다. 손금에는 수상학에서 말하는 운명선, 생명선, 재물선, 월구, 금성구, 자식선, 태양구 등등의 여러 가지 선들이 존재한다. 화자가 선과 선이 말하는 선천적 삶에 대해 관찰하고 자신의 현재 삶과 비교해 보는 행위는 포괄적 의미의 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관점이란 자신만의 영역이며, 자신만의 세계관이며 자신만의 가치인바, 같은 손금을 보면서도 화자의 삶에 투영된 시간과 경륜에 따라 무한정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손금의 해석을 읽다 주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오른손의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화자만의 메시지일 것이다.
문장에서 적절한 은유나 비유, 환유 등의 기법을 메타포어라 할 때, 이 메타포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문장의 세련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공감의 영역을 획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영혜의 「손금 보는 밤」은 손금을 통해 인생에 대한 짙은 사유를 적절하게 비유해 보여주고 있다. 손금이 손금에 국한되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의 주장과 주의에 대한 삶의 경건한 메시지를 공유한다는 것은 분명히 시에서 메시지의 배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
사람 인人자 둘, 깊이 새겨진 오른손과/ 내 천川자 흐르는 왼손 마주 대본다/사람, 사람과 물줄기가 내 생의 요약인가/ 물길 어디쯤에서 아직 합수하지 못한/ 그 누구 만나기도 하겠지/ 누설되지 않은 천기 한 줄 훔쳐보고 싶은 밤/ 소나무 가지에 걸린 보름달이/ 화투장같이 잦혀져 있다.
시는 메시지 전달이다. 시인의 눈을 통해 본 세상의 기준이나 철학이나 망막 뒤에 산재한 여러 수종의 의미를 자신만의 잣대로 바깥에 일갈하는 전달이라는 것이며 전달된 메시지는 독자의 공감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 전달이라는 것에만 몰입한다면 밋밋한 시가 될 것이나 시인은 성찰을 통해 운명은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미래지향의 희망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아직 합수하지 못한 그 누구를 기다리는 행위, 화자는 종료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스크린을 묵묵하게 응시하고 있다. 아직은 내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누설되지 않는 천기 한 줄을 훔쳐보고 싶은 것이다. 시를 읽는 독자인 누구에게도 누설되지 않는 천기는 있을 것이며, 그 천기로 인해 고단한 삶의 배경을 잠시 잊을 수 있다는 것이며, 어두운 밤에 소나무 위에 걸린 보름달이 환하다. 이것이 화자가 독자에게 하고 싶은 화자의 시점이며 메시지인 것이다.
“화투장같이 잦혀져 있다.” 패는 이미 화투장처럼 다 깔렸다. 하지만 다음 내 순서에서 환한 보름달이 내 것이 될지도 모른다. 오른손은 다음 장을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또 다른 관점의 삶과 나, 또 다른 시점의 나와 삶에 대해 사유하고 인식하는 감각의 포인트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Point of view라는 영어적 표현에 가장 적절한 별개의 시점화視點化라고 할 수 있으며 시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과 시간 사이의 어느 한 국면을 포착하고 지각의 범주를 넘어 내면의 울림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시는 독자와 공유하는 범위가 무한하다. 관념이 무수한 글이나 미사여구로 채워진 수사적 문맥이 아닌 사실에 입각, 현상의 배후에 담긴 시선이 문장의 내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내면에 충실하다는 것은 사유의 내면이 세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명과 삶을 보는 시선의 허리춤에 날카롭고 예리한 시도詩刀를 간직한 것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도시에서 향기의 우화는 이월이면 시작된다
긴기아눔 난 자궁 속에서 향기의 날개가 파닥거릴 때
하얀 꽃잎들은 작아서 위험하다
시간은 기다림의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는지
수백 개 날개들이 날아다니는 무채색 공간
날개의 체취는 네가 즐겨 쓰던 향수를 닮았다
어둠 속에서는
날개의 농도가 깊어질 수 있을까
아직 겨울이 살아 있는 정오의 햇살이
삼월의 거실을 쓸모없이 키울 때
네게 보내고 싶은 긴기아눔 날개 한 쌍
날개라는 말은 너무 쉬워
네 어깨에 달아줄 수 없고
너와 무관한 사치는 왜 철없이 황홀한지
거실 바닥에서도 향기를 말릴 수 있을까
캄캄한 너의 하늘은 건널수록 기다려지는 삼월인데
네가 올까 봐
네가 올까 봐
― 박정인, 「우화羽化」 전문(『문학리더스』, 2024, 겨울 창간호)
관찰에서 관점觀點으로, 관점에서 다시 시점視點으로, 시점에서 다시 시점詩點을 전개하는 전개과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사유의 도출은 충분히 의미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을 보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언어적 표현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박정인의 「우화」에서 시인이 본 것은 정작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온 나비가 아니라 나비라는 형상화로 전달하고 싶은 화자가 기다리는 봄의 의미(계절의 변화, 사건이나 심상의 변화, 삶의 변화 등 모든 전이적 심상의 변화)가 아닐까 싶다.
“날개라는 말은 너무 쉬워/ 네 어깨에 달아줄 수 없고/ 너와 무관한 사치는 왜 철없이 황홀한지”라는 부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관’이라는 단어다. 나와 무관한, 너와 무관한, 우리와 무관한 등의 확장의 내연을 가진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어떤 형상화된 이미지를 추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언어적 형상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자신이 말할 메타포어를 근접한 단어의 경연을 통한 이웃한 단어와 행간,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 모든 문장의 포괄적 결론이 독자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존재하게 만든다면 이미 그 형상화는 성공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향기의 우화”라는 첫 연의 행간에서 시인이 생각하는 “이 도시”라는 것의 실체는 쉽게 드러난다. 향기가 필요한, 향기가 있어야 할, 향기가 없는, 이라는 추론은 거듭 문장의 확장을 추구하며 결론에 대한 형상화로 진화하는 것이기에 박정인의 작품 속 나비와 향기는 모두 이 도시라는 정체성을 잃은 도시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다소 궤변적인 논리도 성립하는 것이다.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은 다 꽃길이라 믿었던 시절
득음한 꽃들의 아우성에 나도 한때 꽃을 사모하였다
꽃을 사모하니 저절로 날개가 돋아
꽃 안의 일도 꽃 밖의 일도 두근거리는 중심이 되었다
꽃술과 교감했으므로 날개 접고 앉은 자리가 모두 꽃자리였다
꽃길을 날아다녔으나 꽃술을 품었다고
흉금에 다 아름다운 분粉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겹눈을 가지고도 읽지 못한 꽃독에
날개를 다치고 먼 남쪽 다산에 와서 앉는다
낮달이 다붓하게 따라온다
주전자에는 찻물이 끓고 *꽃 밖에서 훨훨 날아다니고
꽃술을 사모하여 맴돌지는 말아라*
오래전 날개를 다치고 이곳에 먼저 와서 앉았던 사람이
더운 붓끝으로 허공에 쓰고 있다
*정약용의 시 「제협접도題蛺蝶圖」에서 인용
― 허영숙, 「나비 그림에 쓰다」 전문
나비가 꽃에 가까이 가는 것은 꿀을 얻기 위함이며, 꽃은 나비에 의해 꽃가루를 수정하는 서로 상생相生하는 본능적인 관계이다. 하지만 관찰이 여기서 멈춘다면 관찰이라는 단어에 충실한, 다만 관찰에 불과할 것이다. 나비와 꽃의 상관관계를 사람과 사람, 더 나아가 인칭을 바꿔 그 여자와 그 남자로 해석하는 것을 視點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視點은 어쩌면 詩點이라는 말과 묘한 희언戲言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의 발화점이 된다는 것이며, 어떤 부분을 사유화하는가에 대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꽃을 사모하니 저절로 날개가 돋아/ 꽃 안의 일도 꽃 밖의 일도 두근거리는 중심이 되었다/ 꽃술과 교감했으므로 날개 접고 앉은 자리가 모두 꽃자리였다
나비의 지각이 꽃을 사모한 것은 분명 아닐 것이며, 꽃 밖의 일이 두근거리는 중심이 된 것도 아닐 것이다. 다만 시인의 망막이라는 거름망을 거쳐 시적 질감에 도달한 것은 저절로 날개가 돋은 나비와 두근거리는 중심이 된 꽃 밖의 일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점 중에서 주시점注視點(어떤 대상을 볼 때에 시력의 중심이 가 닿는 점)의 변화를 보게 되며 그것이 시의 형상화 작업에 기여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상이라는 것은 대상과 그것을 보고 느낀 그 속의 무엇까지를 포괄하여 모두가 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를 시적 대상이라는 말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인용 부분을 영문으로 다시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As I loved flowers, wings sprouted; the things within flowers and those outside became a palpitating center. Since I communicated with pistils, the places where I sat folding wings were all flower places,
“꽃을 사모하니”, 사모라는 단어가 영어로 Love라고밖에 표현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많으나 영문적 느낌으로 읽어도 꽃과 나비의 상상적 유추와 비롯된 사유의 폭이 다분히 확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날개 접고 앉은 자리가 모두 꽃자리였다
the places where I sat folding wings were all flower places,
관찰에서 관점으로, 觀點에서 다시 視點으로, 視點에서 다시 詩點을 전개하는 전개과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영어의 표현이나 우리말의 표현이나 사유의 도출은 충분히 의미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을 보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언어적 표현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나. 메타포어를 형상화한다는 것
여러분 자신의 시가 탄생했던 그 지점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것은 합리적이기보다는 이미지적인 논리에 가깝습니다. 이 이미지적인 논리를 온전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작가들은 소통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는 너무나도 소통이 중요하지만 작가란 자신의 고유성을 자신의 언어로서 보여주는 용기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소통하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시인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통, 공감은 굉장히 멀리 있고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쫓아가야 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울릴 수 있으며 그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의지 자체가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러나 지나치게 자폐적인 언어나 몸에 배어 있지 않은 실험성을 트랜드로 내세우는 젊은 시인들의 과장된 포즈도 부담스럽습니다.
― 김경주, 「나는 시를 이렇게 쓴다 (2)-작가의 고유성과 소통의 의지」 중에서 인용
관찰과 관점 그리고 시점에 대한 문제는 결국 불특정 다수 독자와의 소통, 교감이며 공감이라는 것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방법론이 수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느낀 세상에 대한 공유라는 점에서 시는 이러한 질감의 교류를 통한 문학의 보편성과 당위성을 제공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로 음악音樂과 음학音學의 경계를 말한다. 시를 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시로 읽는 것이 아니고 절제된 영혼의 언어로 읽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음악이 음악일 때 가장 음악적일 수 있으며, 반대로 음학이 될 때 어쩌면 가장 시적일 수 있는 것이 가치 기준이며 그 상대성 역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현상에 대해서 자연물리학적인 관점으로 현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학적 관점으로 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말이다. 물리학적인 관점과 문학적 관점의 시선은 정확히 다르겠지만, 그 결과의 산물은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시는 독자라는 정확한 대상을 갖고 있다. 더 좁히면 ‘나’라는 대상 역시 포용하고 있다. 나와 너 우리라는 대상의 세계관이나 우주적인 관점의 관찰이 아니라 그 배후를 읽는 행위는 삶의 정신적인 부분은 좀 더 윤택하게 하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멈춤의 시점과 보이는 것의 시점을 어느 위치에서 조망하고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관찰과 시점이며 시에서 말하는 현상학에 가장 적확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인은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또한 오랜 관찰의 시간 역시 놓치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선가 자신이 포착한 것을 자신이 채집한 언어로 메타포어화 하는 것이 시인의 몫이라는 것이다.
3. 결론
형상화의 궁극적 가치는 소통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막힘이 없이 잘 통한다는 것과 의견이나 의사 따위가 남에게 잘 통함이라고 되어 있다. ‘남’은 자신과 다른 사람이며, ‘다르다’의 의미 속엔 외형과 내형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경륜이 다르고 감정의 깊이나 사유의 한계 역시 다를 수 있다. 내 시점의 어느 부분에서 포착한 삶의 한 지점을 언어적 형상화해 타인에게 전이를 넘어 감동의 수준을 교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이는 예술의 속성이 갖고 있는 한계와 한계 이상의 무엇을 내포하는 일이다.
소통은 영어로 communication이며, 생명과학에서는 facilitation이라 하여 ‘촉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2가지 이상의 자극을 가할 때 그 효과가 가중되어 단독 자극 효과의 합보다 현저히 커지는 현상이며, 어떤 조건에 의해 세포 간 흥분 전달이 쉬워지는 것을 말한다.
― 『생명과학사전』에서 인용
시문학에서 생명과학을 인용한다는 것은 지극히 부담스러운 행위이지만 감히 인용한 것은 ‘세포’라는 단어가 주는 인체 구성의 최소 단위 때문이다. 정신의 교류 내지 감응은 생체학적인 우리 몸의 구조 중 가장 기본인 세포에서조차 요구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자극에 대한 그 효과가 가중된다는 것이며, 바꿔 말하면 시의 언어적 형상화의 궁극은 소통으로 인한 삶의 원활한 교류와 촉진을 통한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관점은 관점과 나의 소통이며, 시점 역시 나와 시점의 소통이라는 것은 다른 무엇에서 또 다른 무엇을 획득하는 원초적 행위일 수 있다. 하지만 시 한 편에서 돈오頓悟를 단번에 깨우친다는 것은 위증이다. 삶의 그 많은 관점과 시점 역시 돈오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를 쓴다는 것과 읽는다는 것은 이렇듯 돈오가 아닌 돈오점수頓悟漸修로 가는 과정의 하나라는 생각이다.
시점의 선택과 내용의 변화
1인칭 관찰자 시점은 화자가 대상 혹은 세계를 관찰하는 것으로 화자와 텍스트 간의 거리는 멀지만 텍스트와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즉 화자의 이야기가 객관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독자가 자세히 들려다 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시점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제어하는 통제의 원리에 의존한다. 따라서 자아를 타자화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객관화함으로써 보다 냉정하게 자신의 생각을 보여줄 수 있다. 어조에 있어서도 차분하고 침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3인칭 시점은 1인칭 시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폭을 보편적으로 확대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는 1인칭 시점이 안고 있는 주관성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로 관찰하고 묘사하는 보여주기showing 기법에 의존하는데, 이 시점의 강점은 1인칭 시점이 안고 있는 동일화의 오류에서 벗어나 사물을 그 자체로 바라보게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화제는 우리들 눈앞에 전경화前景化되어 보이고 어조 또한 침착함을 유지한다. 3인칭 전지적 시점은 말 그대로 화자가 전지전능한 관점에서 텍스트에 관여하는 것으로 내부 심리나 내용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데 용이하다. (…)
시 창작에 있어 어떤 시점이 좋은가는 정답이 없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하는 기술적 태도가 요구될 뿐이다. 이에 따라 시적 구조뿐만 아니라 미적 완성도도 달라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박주택 「시점의 선택과 내용의 변화」 부분 인용
이처럼 시점은 인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시에서 화자의 감각을 어떻게 형상화하는가 하는 문제는 문장의 구조적인 측면과 구조를 탄탄하게 받치는 언어의 채집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시점은 시의 생명력을 부가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독자라는 매개체를 수렴하고 시의 메타포를 신선하고 명징하게 전달하는 의미 전달의 핵심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꽃술을 품었다고 흉금에 다 아름다운 분粉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 허영숙, 「나비그림에 쓰다』 일부 인용
꽃술을 품고, 날개가 돋고, 꽃 밖의 일이 두근거리는 중심이 되기까지 어느 지점의 포착점에서 성찰의 나를 돌아본다는 행위는 점진적인 증명의 행위이다.
시가 아름다운 것은 운율이나 멋진 문장의 한 줄이 아니라 현미경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본 생명과 사물의 경이로움의 배후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시는 내 몸속의 영혼을 깨우는 일이며 타인의 영혼을 깨우는 일이다. 몸짓의 언어가 아닌 섭리의 언어라는 포자胞子를 허공에 띄우는 일이다. 씨 한 톨이 개화하기까지 여린 씨앗은 딱딱한 외피를 뚫고 나오는 인고의 시간을 제 몸에 갈무리한 채 북풍을 견뎌냈을 것이며, 태양 아래 갈증의 시간을 이겨내 드디어 개화한 제 몸에 꽃술을 품었을 것이다. 꽃술을 관점이라고, 흉금을 시점이라고 간주할 때 다 아름다운 분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는 언어적 형상화에 대한 시인 자신의 독자적 포집이 상대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메타포어를 형상화한다는 것은 視點의 핵심인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문제풀이인 것이다. 이는 나와 더불어 삶을 영위하는 모든 타인에게 어느 한순간의 화두를 교류하는 위대한 성찰이라는 생각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시학』에서 개연성과 필연성을 유지한 질서를 강조했다. 그 기본 골격의 근간 안에서 화자의 시점이 살아 있는 시를 읽는다는 것은 공감을 넘어 감동이다. 시의 순기능은 정화淨化에 있다.
한 해가 출발하고 있다, 작년 1년의 화두가 무엇일까 내게 되물어 본다. 돈오참수頓悟慙羞를 위한 정진이었다며 자위해 본다. 하늘은 무량했고 각고刻苦라는 거울에 나를 비추니 허공은 비어 있었다. 우두망찰이라는 표지판 앞에서 방향성 잃은 핸들이 교차로의 방향을 가늠하고 있었다. 겁怯에 겁을 덧씌운 시간이 좌상귀의 화점에 웅크리다 끝내 화점을 찾지 못했고, 천원天元의 하늘은 멀기만 했다. 평론이라는 것이 본래 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딘 손끝은 검은 돌만 엉거주춤하게 쥐고 있었다. 늘 불계패를 당한 듯 입이 쓰다. 언제나 삶이라는 바둑판에 선명한 승勝의 전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초의 한 점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 집들은 커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김부회 (문학 리더스 2025 봄 호 평론 기고)
댓글목록
무의(無疑)님의 댓글
읽었습니다,
잘
퍼 갑니다,
집으로 ....
건강하시지요,
좋은 날 뵙겠습니다.
金富會님의 댓글의 댓글
긴 글 송구합니다.
읽어주시니 고맙구요
건강하세요.
정 시인님.
장승규님의 댓글
최초의 한 점을 천원에 두셨네요.
불계패라니요.
나중에 계가를 해보시면
사실은 반집승입니다.ㅎ
계속 좋은 평론 부탁합니다.
김부회님은
우리 시마을 동인들의 자랑입니다.
金富會님의 댓글의 댓글
한 점을 천원에 두는 것을 예전에 조치훈 혹은 다케미야 류 라고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회장님 바둑 잘 두시면 언제 대국 한 번...
저는 1급 정도 됩니다만....
건강하시구요...덕분에 동인방이 환하게 움직입니다.